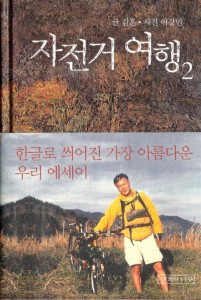그 궁금함이 이 책을 읽게 된 동기였다.
김훈.
예전에 한창 인기를 몰던 TV 드라마 “불멸의 이순신” 원작 소설 작가로만 기억되는 사람이었다.
나는 그 원작 소설을 읽지도, TV 드라마를 보지도 않았었다. 단지 내게 중요했던 것은 사람들한테 큰 인기를 끌 정도로 필력을 가진 소설가가 쓴 여행기라는 점이 중요했다.
그만큼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좋아했다면 분명 좋은 이야기를 해 줄것 같아서였다.
이야기는 여행의 시작부터 끝까지에 이르는 시간의 흐름대로 쓴 느낌이 나지 않았다.
짤막짤막한 단편들로 구성된 이야기들로 이루어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.
사실, 어디가고, 그 다음은 어디로 가고, 이런 이야기는 주의깊게 보지 않았다.
실제 작가도 그렇게 중요하게 쓴 것 같지도 않았고.
글쓴이는 여행기라는 제목을 달아놓았지만 자신의 이야기는 그리 많이 하지 않았다.
자신이 갔던 곳, 그곳에 얽힌,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다.
그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다.
자신이 느꼈 던 것을 글로 적고, 여기 참 좋습니다, 오세요, 보세요.
그동안 많이 봐왔던 여행기가 아니었다.
좋은 작가들은 사물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 참 묘한 감각을 지녔다.
이 글쓴이도 좋은 작가라고 생각한다.
어느 부분에서 위치에 대해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었다.
그 표현이 너무 감성적이면서 마음에 들었다.
여기에 그 부분을 살짝 적어본다.
선박은 자신의 위치를 아는 그 앎의 힘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늠한다. 내가 어디에 처해 있는지를 알아야만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알 수 있다. 철새들이 태양의 기울기나 지구의 자장을 몸으로 감지해가며 원양을 건너갈 때 철새는 자신의 위치를 스스로 알지 못해도 천체가 보내주는 신호에 따라 방향을 가늠할 것인데, 인간의 몸에는 그 같은 축복이 없다. 그래서 선박을 움직여 대양을 건너가는 항해사는 “나는 어디에 있는가?”라는 질문에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야만 목적지 항구에 닿을 수가 있다. 그리고 그 ‘나’의 위치는 물 위에서 항상 떠돌며 변하는 것이어서 항해사의 질문은 늘 새롭게 태어난다. 지나간 모든 위치는 무효인 것이다. 바다 위에서 “나는 어디에 있는가?”라는 질문은 미래의 시간과 함께 인간의 앞으로 다가온다.
길다.
이 글중에서 단 한문장을 꼽자면 아래 문장을 꼽고 싶다.
바다 위에서 “나는 어디에 있는가?”라는 질문은 미래의 시간과 함께 인간의 앞으로 다가온다.
…좋은 작가가 쓴 좋은 여행기. 그리고 좋은 표현.
좋다. 너무나 좋다. 🙂
http://www.youtube.com/watch?v=oMWNJ12v0BU